막내의 도시락을 싸며
- 작성자
- 벌집아씨
- 등록일
- 2007-08-23 09:26:04
- 조회수
- 2,289
어린시절 눈뜨면 엄마 아빠는 벌써 밭에 가셨는지 보이지않고 방 윗목엔
꺼머둥둥한 보리밥에 주먹만한 감자를 넣은 밥이 놓여져 있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밥을 먹었던 기억은 없다.
어느날 다정한 엄마가 학교가라며 깨우는 소리는 잠자던 얼굴에도 미소를 머금게
했었다.
그소리가 더 듣고싶어 못 들은척 있으면 궁둥이 툭툭 두두리며 깨워주시던 엄마
너무 기뻐 문을 열고 뛰어나가지만, 그 다음이 늘 문제였다.
엄마가 계신날은 다름아닌 비가 내리는 날이었던것.
그때부터는 학교 갈일이 걱정이었다. 지금처럼 우산이 흔하게 있는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비가림할것이 마땅이 있던 시절도 아니었으니
그렇게 중학생이 되었을때는 6남매를 키우던 엄마는 매일 맞벌이로 바빠
도시락 반찬은 늘 비슷했었다.
크는 딸 생각해 계란 후라이해서 도시락얼 덮어주셨고, 만만한 콩나물 무침
그래도 고추장 한수저 넣고 흔들어서 비벼먹는 맛은 끝내줬었다.
그런데 어느날부턴가는 멸치 조림과 새우조림으로 변신을 했고
아이들은 무척이나 부러워 했었다.
지금의 아이들이야 학교에서 급식이 지급되니 엄마들의 일이 조금은 줄었겠지만
요즘 아이들은 우리가 애타게 기다리다 흔들어 비벼먹던 도시락 난로위에서 따끈따끈
한 도시락을 먹던 맛을 알지 못하리라.
그런데 어제 우리 막내 점심을 굶고 왔다고 하기에 급식이 안 나왔냐고 묻자
느끼해서 먹을수가 없어 그냥 왔다는것.
정우도 처음에 그런경우가 있어 몇달 김밥을 싸주던 때가 있었다.
처음 입학했을때는 양식과 한식이 같이나오니 골라먹는 재미가 있다며 좋아하던
녀석이 두달을 채 못먹고 도시락 타령을 했었는데, 끝내 굶고 올줄이야.
점심 굶을라면 많이 먹고 가야한다는 막내녀석을 처다보며
" 도시락 싸 줄까"?
도시락 타령 할때마다 안된다고 했던 엄마가 왠일인가 싶은지 한참 처다보곤
"그럼 좋지요"
속으론 굶어야하는 막내가 안스럽기도 했지만, 내가 가끔 꺼내볼수있는 추억을
우리 막내에게도 만들어 주고 싶었다.
"반찬은 고추장 볶음하고 고구마순 김치다"
울 신랑은 아무것도 모르고 반찬만 싸준다는줄 알고 굶으면 굶지 어떻게 혼자
다른 반찬을 먹냐며 잔소리다.
어려서부터 조미료를 사용 안하고 먹은탓에 아이들 입맛이 민감한것 같다.
정우도 늘 하는소리
"학교서 먹는 반찬은 열가지가 나와도 다 같은 맛이에요. 조미료맛"
그럴때마다 한마디 한다.
"엄마가 이런것 만들어줄때 잘먹어 둬"
"너희들 마눌 얻으면 이런것 안해주니까"
"엄마가 해주면 되지요"
"엄마는 너희들 김치며 반찬 안 만들어줄거야, 마눌이 해주는대로 먹어야지"
"그럼 엄마가 색시한테 알려주심 되지요"
처음엔 국에 멸치가 있어 싫어하던 아이들도 이젠 아무소리없이 먹으며
이렇게 멸치 몇마리 들어가면 될걸 왜 그리 조미료를 쓰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아이들을 보면 벌써 건강을 생각할줄 아는 나이가 된 모양이다.
도시락 달랑달랑 들고간 막내도 점심 시간을 우리처럼 기다리려나.
도시락을 싸면서 가진것 없던 시절 6남매의 도시락 반찬을 했을 엄마 생각에
가슴이 무거워진다.
매일 같은 반찬이라고 철없는 아들딸들이 투덜거릴때 엄마는 무슨 생각을 하셧을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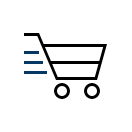


댓글목록
벌집아씨님의 댓글
아푼 추억도 한없이 고마웠던 추억도 지금은 모두가 아름답기만 합니다. 막내녀석도 급식을 안하는 친구와 같이 나누어 먹었다며 오늘도 따끈따끈한 도시락 또 들고 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