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어, 말어
- 작성자
- 벌집아씨
- 등록일
- 2008-06-18 17:12:37
- 조회수
- 2,204
파릇 파릇 뽕나무에 까맣게 달린 오디를 볼때마다 생각나는 추억하나 있습니다.
추억이라고 하기보다는 아픈 기억이지요.
그시절 농촌의 아침은 지금보다 더 바쁜시절이었나 봅니다.
아침먹고 부모님들은 소리소문없이 밭으로 나가시고 우리들은 보자기에 책을 싸서
허리에 두르고 학교로 달음질 칩니다.
학교가 멀어 한가롭게 걸어가본 기억이 없습니다.
달음질처 중간지점에 이르면 밭둑 아래로 뽕나무가 일열로 서있습니다.
우린 약속이나 한듯 나무로 올라가 얼굴에 꺼멓게 칠한것도 잊은채 배불리 따먹고
친한 친구들 가져다 주기위해 머우잎과 칡잎을 동그랗게 말아 그곳에 가득따서
강아지풀로 묶어가지고 다시 학교로 갑니다.
우리가 오던것을 기다렸던 친구들도 금방 얼굴 여러곳에 그림을 그리곤 했지요.
그러던 어느날 5학년이되어 학교는 더 멀어졌습니다.
갈때와 달리 집으로 돌아오는길은 허느적 허느적 할일 다하고 옵니다.
길옆에 시그름한 시강도 꺾어먹고 찔레도 꺾어 껍질벗겨먹고 그러다 더우면
깨끗한 냇가로 풍덩 한두시간 물놀이를 합니다.
세시쯤되면 군인 아저씨들이 단체로 수영을하기위해 냇물로 나오면
우리는 얼른 옷을입고 군인 아저씨들의 고함소리를 들으며 집으로 갑니다.
"이쁜 언니있으면 데리고 와라. 건빵 많이줄께"
한참을 오다가 배가 고프면 다시 뽕나무로 달려갑니다.
뽕나무에 올라가 턱하니 걸터앉아 오디를 따먹고 있는데 갑자기 뿌지직소리와 함께 쿵^
제가 뽕나무에서 떨어진것입니다.
올라가 앉은 가지가 늘어지자 아이들이 너도나도 잡아댕겨 오디를 따먹으려고
잡아댕기자 나무가지가 꺾어졌습니다.
하늘이 노오랗게 변하는 경험을 그때 처음으로 하게되었지요.
땅에 손을 대고 일어나려고 힘을주다 그대로 고함을치며 쓰러졌습니다.
아이들은 어쩔줄모르고 우왕좌왕하는데 다행이 가까운곳에 친구오빠가 일을하다
보고 달려왔습니다.
팔목에 뼈가 튀어나온것을 본 오빠는 큰 화물자전거에 나를 태우고 읍내로 달렸습니다.
예전엔 자전거도 왜 그리 컸는지 모르겟습니다.
1시간가량 걸려 읍내 병원에 도착 의사선생님은 팔이 두곳이나 금이갔다며
어긋난 뼈를 맞춰야한다며 간호사 두명보고 팔을 잡으라하고 팔을 돌리더군요.
죽도록 아팠지만 그순간에도 내 머리속에는 놀라서 달려오실 엄마얼굴과 야단칠
아빠생각밖에 나질 않았습니다.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들이 놀란 토끼눈을 해선 안 아프냐고 어른도 죽는다고 난리인데
대단하다며 등을 토닥여주셨습니다.
9시가 넘어서 엄마는 허겁지겁 달려오셨지요.
뜨거운 한여름 한달동안 깁스를 하고있던 생각을하면 지금도 소름이 끼칩니다.
깁스한 팔은 왜그리 가렵던지
오늘도 신랑이 그릇가득 오디를 따다주며 비맞았는데도 달다며 갔다 줍니다.
저 오디를 먹어말어? 남들은 먹고 한번 체하기만해도 안먹는다고 하던데
전 그렇게 혼줄이 난 오디가 지금도 맛있습니다.
그때 그 오빠를 다시볼수있다면 고맙다고 꿀한병 얼른 알겨줄텐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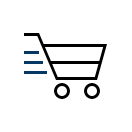


댓글목록
권성경님의 댓글
우리도 엊저녁엔 아지매들이 모여서 옛얘기하면서 수다떨었는데...
학교다녀오더 오디따먹은얘기며 동네 못된친구의 장난으로 길중앙에 파놓은 구덩이에
빠지던일등등...
벌집아씨님의 댓글
에공 고녀석들 지금은 아빠들 되어서 큰소리 치고있는것을 보면 ~~~
이곳은 같이 모여 수다떨 아지매들도 없어 이렇게 컴에앉아 어린시절 또올려봅니다.
자유인님의 댓글
하기사 사흘 굶어 남의 집 담장 안 넘은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 어렸을 때는 어찌 그리 먹어도 먹어도 배가 고팠을까요? 하지만 전 그 때가 더 그립습니다. 필요한 만큼 가지고 나지막한 담장 너머로 남은 것을 서로 건네던 그 넉넉한 인심이 그립습니다.
벌집아씨님의 댓글